'대체불가능한 토큰'인 NFT, 저장된 디지털 기호를 액면이 아닌, 식별번호로 구분하는 것
크리스티 경매에서 최고가에 팔린 NFT는 그림, 구매한 증거로 소유권 주장이 가능한 URL 주소 등 '영수증'이 재판매되는 것
NFT, ‘최첨단 권리증명’ 기법처럼 둔갑돼...최고가 그림을 산 사람도 NFT 투자회사 고위임원으로 알려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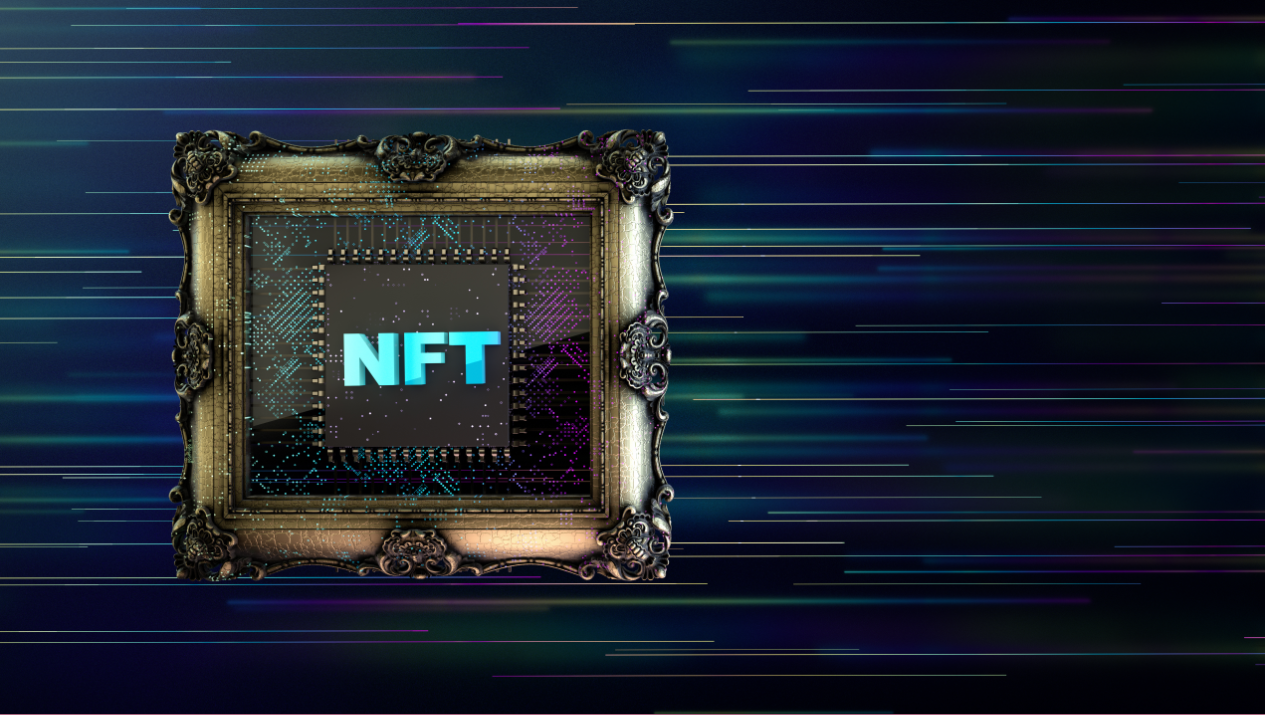
내가 가진 만원과 타인의 만원권 지폐는 다른 종이로 만들어진 서로 구분되는 다른 목적물이다. 예컨대 내 지폐는 낡고 접혔을 수 있고, 타인의 것은 빳빳한 신권일 수 있다. 그러나 둘의 가치는 동일하다. 1만원이라는 액면이 그 가치를 강제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쓰는 종이 돈은 법이 그 가치를 강제한 것이다. 그래서 ‘법정’화폐(legal tender)라고 부른다, ‘법’이 ‘정’한 강제 통용 화폐라는 의미이다. 화폐를 흉내 낸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이다. 나의 1비트코인과 타인의 1비트코인은 서로 구분되는 ‘다른’ 디지털 숫자로 기록되지만 그 가치는 동일하게 취급 받는다.
만약, 액면의 개념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 가치는 각자 별도로 형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서 예로든 1만원권 지폐에 액면개념이 없다면 빳빳한 지폐는 낡은 지폐보다 더 가치를 받을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단 8,000개만 발행된 1998년도의 500원 동전은, 그 액면과 상관없이 희귀함 때문에 100만원 정도에 팔린다고 한다.
이 개념을 디지털에서 흉내낸 것이 바로 NFT이다. NFT는 약자로서 통상 “대체 불가능(Non-Fungible)한 토큰(Token)”으로 번역된다. ‘대체 불가능’이라는 말이 다소 어려워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들릴지 몰라도 그냥 ‘서로 구분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즉 모든 1만원권은 그 가치를 (적어도 액면으로는) 서로 ‘완전히 대체’할 수 있지만, 액면을 없애고 각각을 고유물로 구분하기 시작하면 그 가치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대표적인 NFT는 크립토 키티라는 가상의 고양이를 내세운 이더리움의 ERC-721토큰이다. ERC-721은 이더리움이 만든 NFT 토큰의 표준 프로토콜 이름이다. 각각의 가상의 고양이가 액면이 없는 토큰 역할을 하며, 서로 다른 가격을 형성한다. 2021년 3월말 기준으로 이더리움에는 무려 10,000여가지나 되는 ERC-721 토큰이 발행돼 있다!

원리는 간단하다. 저장된 디지털 기호를 액면이 아닌, 식별번호로 구분하는 것이다. 비유를 들어보자. 원래 비트코인에는 서로를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의 개념이 없다. 그런데, 액면을 없애고 1번 비트코인, 2번 코인이라는 식으로 식별자를 부여해 구분하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이 NFT가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보자. 디지털 사진은 무한정 “복제”할 수 있고, 복제품의 품질은 동일하므로 굳이 서로를 구분할 실익이 없다. 그런데, 복제한 디지털 사진에 일련 번호 등의 고유 식별자를 부여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누군가 ‘가장 먼저’ 복제한 사진이 더 의미있다고 주장하고, 이 주장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래가 성사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복제한 순서와 사진의 품질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도 말이다.
최근 크리스티 경매에서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 디지털 그림 NFT가 무려 6,900 만불(780억원)에 팔린 것이다. 물론 경매에 팔린 디지털 그림은 얼마든지 복제해서 동일한 그림을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다. 다만, 식별번호가 있으므로, 경매에 팔린 것과 나머지 복제품은 구분이 가능하다. 고유하다면 뭐 수백억에 팔릴 수도 있을 것 같은가? 하지만 다음 설명을 들으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크리스티 경매에 팔린 NFT는 그림 그 자체가 아니다. NFT에는 그런 데이터를 담지 못한다. 경매에서 팔린 NFT는 그림을 샀다는 ‘영수증’에 불과하다. 이 NFT는 타인에게 판매할 수 있지만, 그 역시 디지털 그림 자체가 아닌 구매 영수증이 재판매 되는 것이다! NFT에는 해당 작품이 있는 URL 주소나 그와 유사한 정보만 기록할 수 있다.
정리해 보자.
1) A가 자신이 만든 디지털 그림을 어떤 서버에 저장해 두고 그 위치 URL을 담아 NFT를 발행 후 해당 NFT를 구매하면 보관된 디지털 그림의 유일한 소유자로 인정해 주겠다고 “말한다.”
2) 그리고 NFT를 경매에 팔았더니, B가 나타나 780억원에 구매했다는 것이다.
A가 부주의로 서버를 고장내면 원 그림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 NFT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영수증일 뿐 실제 권리는 NFT를 발행한 자가 “약속을 지켜야만” 발생한다. 자동으로 소유권을 집행해 주는 프로그램이나 기관 따위는 없다. 오로지 A를 믿어야만 소유권이 인정되는 ‘위험하고 원시적인’ 방식이다.
NFT는 디지털 작품을 고유하고 안전하게 블록체인에 보관하는 기술이라거나, 소유권이 투명하게 기록된다는 설명은 모두 엉터리다. 주변에서 그런 설명을 들으면 모두 무시하면 된다.
사실 고유한 디지털 그림을 거래하고자 한다면, 영수증만 주고받을 수 있는 블록체인이나 토큰이 아니라 전자서명을 이용해 실제 디지털 그림 데이터 자체를 받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NFT라는 원시적인 방식이 ‘최첨단 권리증명’ 기법처럼 둔갑된 이유는 코인을 둘러싼 그간의 수많은 요설을 생각해 보면 쉽게 짐작이 갈 것이다.
그렇다면 그림을 780억에 산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최근, NFT를 780억원에 구매한 자가 다름아닌 싱가포르의 NFT 투자회사에서 일하는 고위임원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있는 자들이 자신의 돈을 어떻게 쓰든 그들의 자유이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기망행위였다면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함은 자명할 것이다. 그간 코인 시장은 얄팍한 신조어를 수없이 만들어 내며 일반인들의 호주머니를 끊임없이 노려왔다.
NFT는 기술과 기망 중 과연 어느 쪽일까?
이병욱 교수는 KAIST에서 전산학을 전공한 금융전문가다.
현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MBA 주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그의 저서 ‘블록체인 해설서’는 대한민국 학술원이 선정한 2019 교육부 우수학술도서이기도 하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 전문가로, 특히 금융권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위 등 여러 기관에 자문을 해 주고 있다.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justin.lee@assist.ac.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