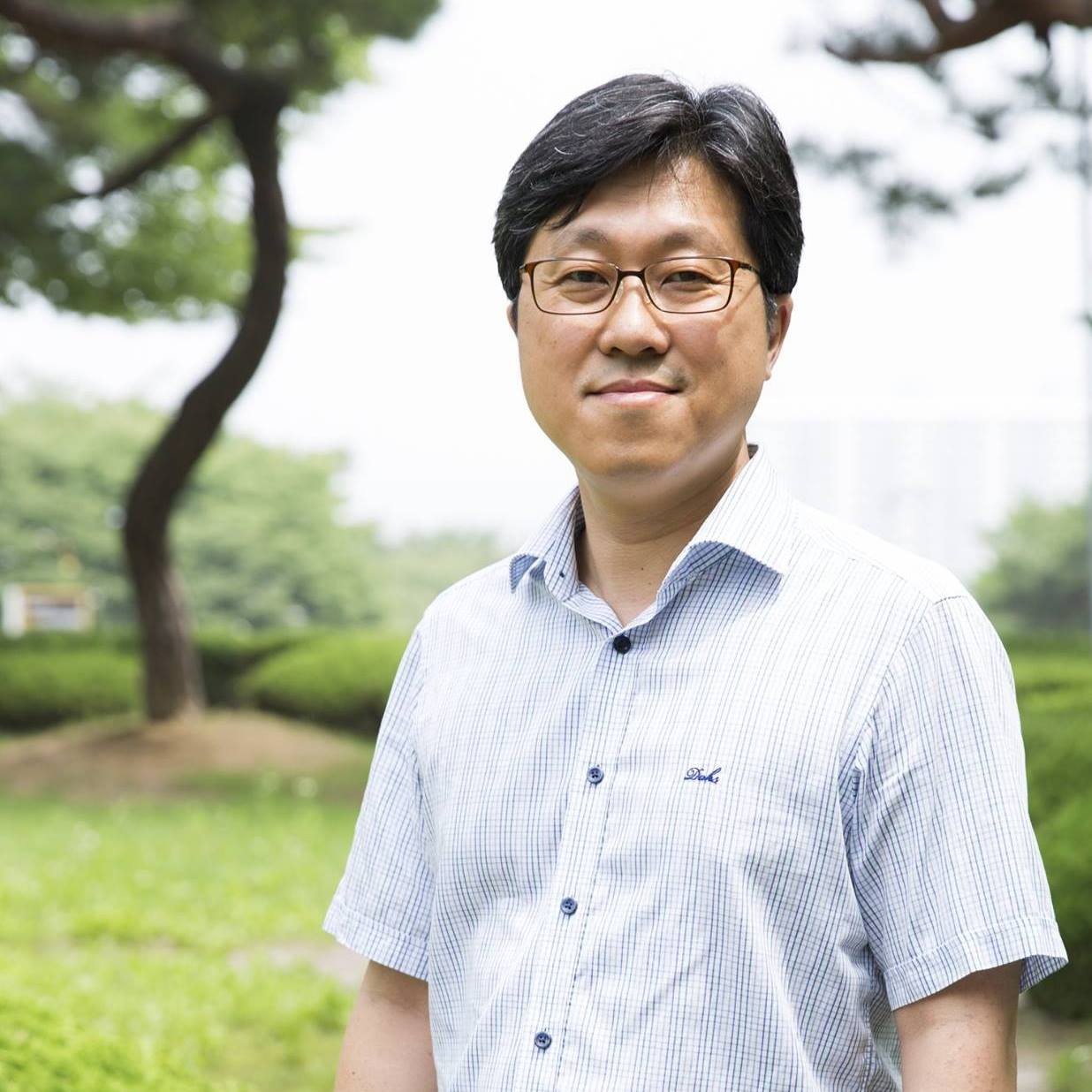
교육은 언제나 인간의 정체성을 묻는다.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가르쳐서 도달하려는 목표, 즉 완성된 인간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근대 교육의 목표는 지적 인간을 만드는데 그 목표가 있었다. 인간이 지성적인 존재라는 전제는 근대의 부인할 수 없는 명제였다. 우리는 지성을 이용해서 산업혁명 이래 우리의 문명을 여기까지 발전시켜 왔다. 이성, 논리, 지식체계 없는 현대 문명을 상상할 수 없다. 당연히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인간을 만들기 위한 교육이 기본이 되어왔다.
인간에 대한 진화생물학적 지식이 발전하게 되면서, 지성을 위한 근대 교육을 좌뇌 중심의 교육으로 바라보는 시야가 생겼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좌뇌는 언어, 논리,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고, 우뇌는 이미지, 추상, 감성적 판단을 담당한다. 언어, 논리, 이성 위에 건설된 근대 문명은 집중적인 좌뇌의 활용과 계발을 통해 가능했다. 교육은 당연히 좌뇌를 좀더 자극하고 발전시키는 쪽으로 설계되어 왔다. 그런 교육체계 속에서 우리는 자주 IQ(Intelligence quotient) 테스트를 하고 선다형 지문에서 답을 골라왔다. 더불어 추상, 감성 등은 잉여의 감각으로 은근히 배제되어 왔다.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이런 양상에 큰 변화를 만들어 냈다. 영상을 핵심으로 하는 전자매체 시대가 열리자, 자연스럽게 우뇌의 가치가 재발견되었다. 감성을 통해 이성에 도달하고, 추상의 힘을 빌어 논리에 도달하고, 이미지를 활용해 의사 소통하는 능력이 필요해지면서, 우뇌를 자극하고 발전시켜야 할 필요 또한 획기적으로 늘었다. 당연히 좌뇌 중심의 문화도 변화하게 되고 좌우뇌를 골고루 사용해야 하는 균형적 문화로 나아가게 되었다. 월터 J. 옹은 이런 문화를 ‘제2의 구술성’이라고 일컫는다.
감성이 중시되는 구술성의 전근대 문화에서, 인쇄시대의 이성적 근대문화로 나아갔다가, 현대 전자매체 시대에 이르러 이성을 바탕으로 감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대로 ‘정-반-합’의 과정을 거쳤다는 말이다. 다니엘 핑크는 좀더 직설적으로 이 시대가 뇌의 전체를 쓰는 시대, 전뇌(全腦, Whole New Mind)의 시대라고 말한다. 전뇌의 시대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융합형 지능, 융합 인재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고, 기존 지능에 감성과 상상력, 예술의 힘 등을 포함하는 다중지능 개념을 중시하게 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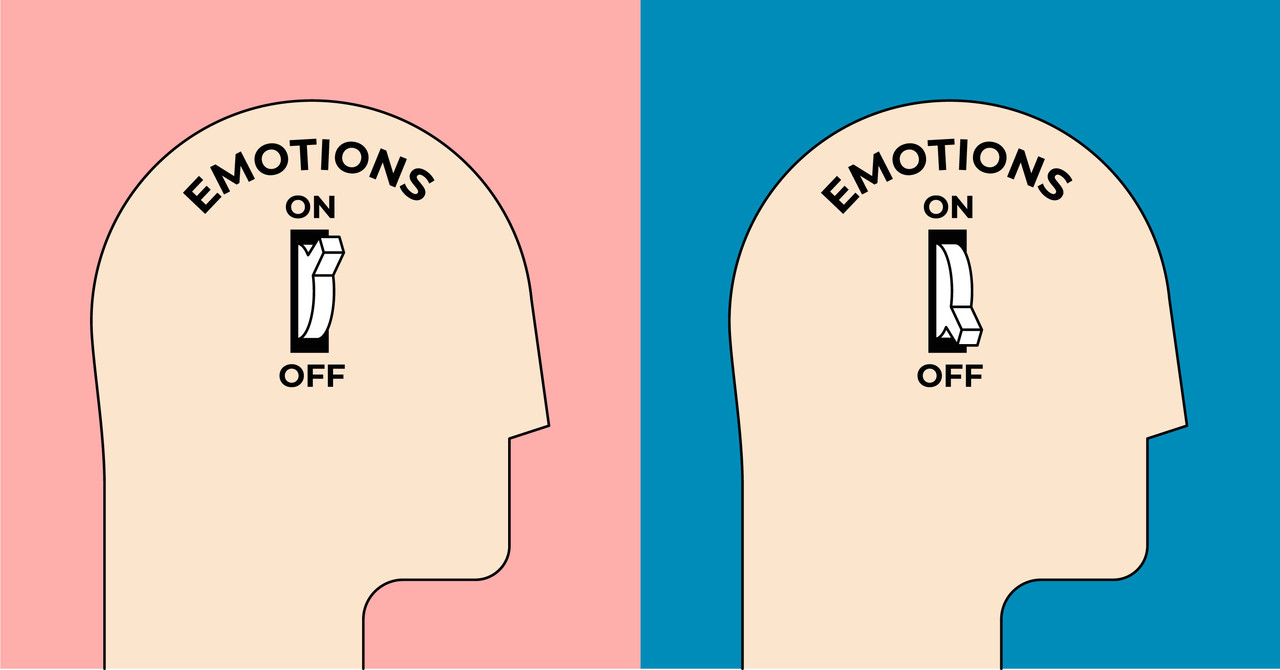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좌뇌가 담당해야 하는 일을 점점 더 많이 기계의 영역으로 옮겨 놓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형식의 지식 축적, 연산, 유용한 정보의 추출 등은 이미 많은 부분 IT 기술이 담당하고 있다. 사람의 능력은 이제 정보를 축적하고 재배치하는 능력에 의해 평가되지 않고, 이미 축적되고 배치된 정보를 가지고 얼마나 창조적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공감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 평가된다.
다니엘 핑크는 이런 시대를 ‘하이컨셉 시대’라고 일컬었다. 좌뇌의 일들이 아웃소싱 되면 될수록, 하이컨셉 시대는 우뇌를 중점적으로 활용하여 창작을 하거나 타인과 공감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니 교육의 방향 또한 갈수록 창조와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새로운 체계를 구축할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AI)은 이런 흐름에 불을 붙이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변화에 놀라운 가속도를 붙이게 된다는 말이다.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되면 사회 각 분야에서 제각각 발전하던 테크놀로지의 영역이 통합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좌뇌의 영역을 인공지능과의 협업으로 해결하고, 예술, 감성, 공감이라는 우뇌의 특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교육의 미래도 같은 방향에서 비전을 찾을 수 있다. 우리 교육은 좌뇌의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포함하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공진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하고, 아직 인간 고유의 영역인 우뇌의 힘을 발전시켜, 새로운 차원의 전뇌적 융합 인재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 교육에서 창조, 공감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고, 인공지능 시대에 의미 있는 부가가치를 생산하며 인류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리라 본다.
언젠가 인공지능이 연산 능력에서 우월한 ‘약한 인공지능’에서 인간의 우뇌 영역인 창조, 공감의 영역까지 능력을 발휘하는 ‘강한 인공지능’으로 발전하면 교육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 아직 그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작동 시스템의 근본적 차이 때문에 강한 인공지능의 개발이 그리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인공지능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창조, 공감의 능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는 점이다.
브레흐만은 <휴먼카인드>라는 책에서, 현 인류가 자신들보다 뇌 용량도 크고, 신체능력도 월등히 뛰어났던 네안데르탈인과 달리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공감 능력’에서 찾는다. 인류 공동체를 위해 서로 공감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헌신하는 인류는 오랜 세월 번성할 수 있었다. 인공지능이 여는 낯선 세계 속에서도 이 점은 변함없을 것이고, 오히려 인공지능 덕분에 인간은 스스로 지닌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은 인간의 창조적 공감 능력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은 더욱 인간의 본질에 가까운 정체성 교육으로 나아가리라는 희망을 품게 된다.
최민성 교수는 현재 한신대학교 한중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동 대학 <창의지성연구소> 소장, 인문콘텐츠학회 연구이사, 한국언어문화학회 연구이사 등을 맡아 일하고 있다.
최민성 교수 image@hs.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