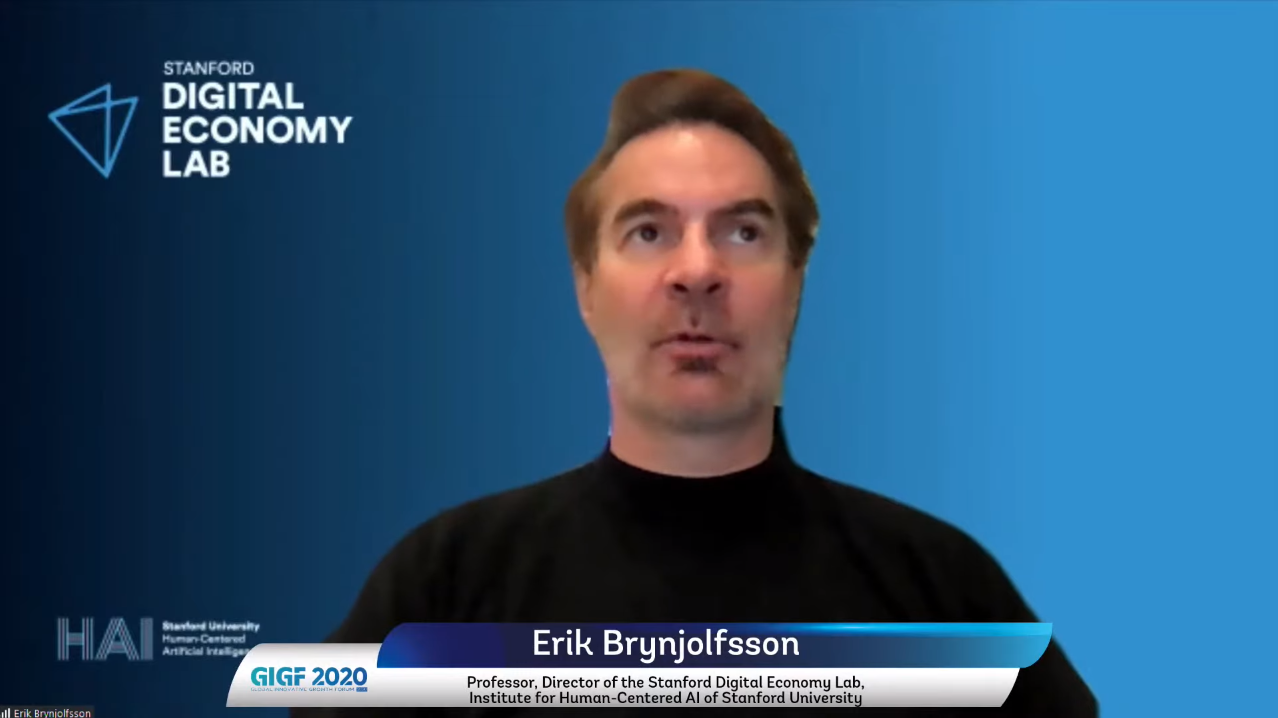
"아직까지 인공지능(AI)의 생산성 붐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향후 직업과 업무의 재설계(Rescaling)에 따른 기술의 생산성 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이 기술의 혜택에 따른 부과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살펴야 합니다."
에릭 브리뇰프슨(Erik Brynjolfsson) 스탠퍼드대학 디지털경제연구소장은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가져올 미래를 이렇게 전망했다. 향후 첨단 산업에 의한 사회적ㆍ경제적 성장을 기대하면서도 기술로 얻는 부과 편익이 소수에게 집중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브리뇰프슨 소장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ㆍ총장 신성철)이 9일 유튜브 생중계로 개최한 '제2회 글로벌혁신성장포럼(GIGF 2020)'에 온라인으로 참석, 'AI 자각 : 경제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미국 경제학자로 디지털 경제와 경영 분야에 저명한 전문가다. 구글, 다보스 포럼, 테드(TED) 등에서 강연했으며 기술 시대에 따른 번영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브리뇰프슨 소장은 이번 발표에서 AI에 따른 사회구조와 경제 변화를 짚었다.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뿐 아니라 알고리즘, 데이터, 딥러닝 등으로 사람만 가능했던 일이 컴퓨터도 할 수 있게 됐다.
그는 "기술이 많은 이점을 가져다 주면서 디지털 대전환에 많은 기여를 했다"며 "향후 인간은 기계와 함께 어떤 일을 어떻게 분담해 나갈 것인지 결정해야 할 기점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브리뇰프슨 소장은 AI 기술에 따른 생산성 붐을 보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 많은 첨단 기술이 발전했으나 지난 20여년간 생산률 증가 폭이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의 생산성은 2.8% 증가했으나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생산성은 1.3% 증가했다.
그는 한국의 생산성 둔화도 눈에 띄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의 성장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된 만큼, 생산성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다.
브리뇰프슨 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0개 중 29개국이 2004년과 유사한 수준의 성장세 둔화를 보였다"면서 "지금까지 개발한 기술이 생산성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현상을 ▲거짓된 희망 ▲잘못된 측정 ▲유통과 소실 ▲기술 구현과 구조조정의 지연 4가지로 설명했다.
이 중 브리뇰프슨 소장은 '잘못된 측정'을 언급했다. 그는 "디지털 기술은 실제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나 국내총생산(GDP)에 산정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디지털 기술을 제외해 GDP를 측정할 경우 이에 따른 생산성도 제대로 측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분배와 확산의 측면에서 소수의 사람만이 부와 기술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 구현과 구조조정의 지연'을 짚었다. 브리뇰프슨 소장은 "다양한 연구개발(R&D)을 거쳐 기술은 현실 세계에 등장한 상황이다:면서 "하지만 다양한 조직의 특성에 맞춰 기술을 최적화로 적용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실제 기술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으나 다양한 조직의 구조조정과 모델링 변화 등을 고려했을 때 기술의 완성과 적용까지 과도기를 거친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 우리가 기술을 바라볼 때 빙산의 일각만을 바라보고 있다"며 "단순한 기술 구현뿐 아니라 기술의 프로세스와 자원의 충족 등 실제 기술을 완성하는 데 여러가지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정리했다.
이어 "기술이 GDP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무형 자산인 기술을 유형 자산으로 만들어야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 에릭 브리뇰프슨 소장의 '머신러닝(ML) 적합성 루브릭 평가'
브리뇰프슨 소장 연구팀은 등급 평가기준의 집합인 루브릭 평가를 활용, 'ML 적합성 루브릭 평가'를 개발했다. 이 평가로 ML 기술이 어느 수준의 직업ㆍ업무를 대체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직업의 ML 적합도'를 분석ㆍ도출했다.
미국 내 900여개 직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으며, 임금 백분위 수로 고임금ㆍ저임금 노동자를 나눠 각각의 직업군에 미칠 영향을 찾았다.
그는 "이번 연구 결과, 비교적 저임금 직업의 경우 ML 적합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면서도 "ML 스킬과 ML 개입 여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모든 직업군 중 일부만 ML에 의한 대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이 같은 분석은 ML의 업무 대체를 향한 대비책을 세울 수 있도록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브리뇰프슨 소장은 기술 발전이 인간의 노동 임금에 ▲대체(Substitution) ▲상호 보완성(Complementarities) ▲수요 탄력성(Demand Elasticity) ▲소득 탄력성(Income Elasticity) ▲공급 탄력성(Supply Elasticity) ▲발명과 번혁을 통한 새로운 과제(New task via invention and transformation) 6가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AI타임스 김재호 기자 jhk6047@aitimes.com
[관련 기사]키스 스트리어 엔비디아 부사장 "무어의 법칙은 끝…AI 시대는 '황의 법칙'이 적합해"
[관련 기사]'AI 4대 천왕' 벤지오 교수, "AI는 공공재... ‘인센티브’ 제도로 기업의 공익적 활동 유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