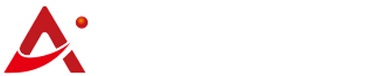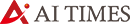정부가 '재생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핵심 인프라인 송전망 건설에 민간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전력(한전)의 심각한 재무 위기 속에서도 전력망 확충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중립 기반의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근 확정한 '123대 국정 과제' 중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전력망 조기 건설을 위해 민간 건설 역량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명시했다.
이는 현재 한전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송전망 사업의 일부를 민간 기업이 인허가·설계·시공까지 일괄 수행한 뒤 한전에 인도하는 '턴키(Turn-key)'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구상이다.
기존에는 한전이 자금 조달, 인허가, 주민 보상 협의 등을 전담하고 민간 건설사에 시공을 하도급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송전망 건설 지연과 지역 반발, 비용 급등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면서, 정부는 민간의 자본과 기술력을 활용한 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한전의 악화된 재무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6조 원, 같은 기간 순이자 비용만 2조2000억 원에 달했다.
상반기 영업이익 5조9000억 원을 기록했음에도, 높은 부채 이자 부담 탓에 정상 영업만으로는 부채 상환이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전은 제11차 송·변전 설비계획을 통해 2038년까지 총 72조8000억 원을 송·변전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 고속도로'의 핵심인 호남–수도권 초고압직류(HVDC) 송전망에는 약 8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한전의 재무 여건상 추진 속도에 제약이 불가피하다.
전국적으로 송전망 건설 예정 지역 주민들의 반대 및 보상 요구 강화가 또 다른 난제다. 최근 시행된 전력망특별법은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을 대폭 상향했다.
근접·밀접 지역 지원금은 기존의 최대 4.5배까지 확대하고,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지자체에는 1㎞당 20억 원 지원한다. 이로 인해 보상비와 사업비가 급등하면서, 재무 부담 경감이 민간 이양 효과를 상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 시각, "민영화 논란 피하면서 제도적 안전장치 필요"
정부의 방침은 '민영화'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민간이 실질적인 인허가 및 건설권을 갖는 구조는 전력망 소유권과 운영권의 공공성에 대한 논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정책 전문가들은 "한전의 재정 부담을 덜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은 타당하지만, 전력망의 통제권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민간 참여 확대가 단기적 공사 속도 향상에 기여하더라도, 수익성 중심의 투자 왜곡이나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도록 세밀한 관리 체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한전의 재무 위기 완화와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전략적 시도다.
다만, 송전망의 공공성 유지와 민간 참여의 효율적 조율, 그리고 보상·비용 관리의 투명성이 향후 정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