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은 영화 제작 전, 제작 단계, 제작 후 등 제작 전반에 걸쳐 도움을 주지만, 인공지능이 관객의 흐름까지 파악할 수는 없기에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진화해야 한다."
28일 개최한 TechArt-2021 국제컨퍼런스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찬철 교수는 ‘딥러닝 시네마: 생성적 인공지능 시대의 영화 제작(Deep Learning Cinema: Film Production in the Age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에 관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교수의 이번 강연은 오늘날 영화 산업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 그리고 AI가 영화 산업에 미칠 영향 분석이 핵심이었다.
정 교수는 영화 제작에 활용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제작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했다. 그가 정의한 단계는 다음과 같다. ▲제작 전 ▲제작 시 ▲제작 후 ▲초기 영화 재생산 그리고 딥 포토플레이(Deep Photoplay).
영화 산업은 불안정하다. 흥행 성공 시 대규모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위험도가 높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제작 전 단계에서 투자 비용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제작사 및 투자 회사의 최종 결정에 도움을 주는 인공지능을 사용한다. 이 같은 플랫폼은 빅데이터에 기반해 제작할 영화의 흥행 결과를 예측할 뿐 아니라 캐스팅과 배급, 마케팅 전략을 조언하기도 한다.
할리우드에서 도입 중인 AI 흥행 예측 시스템 시네리틱(Cinelytic)은 정확도 85%의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 하지만, 정 교수는 인공지능이 관객의 흐름까지 파악할 수는 없기에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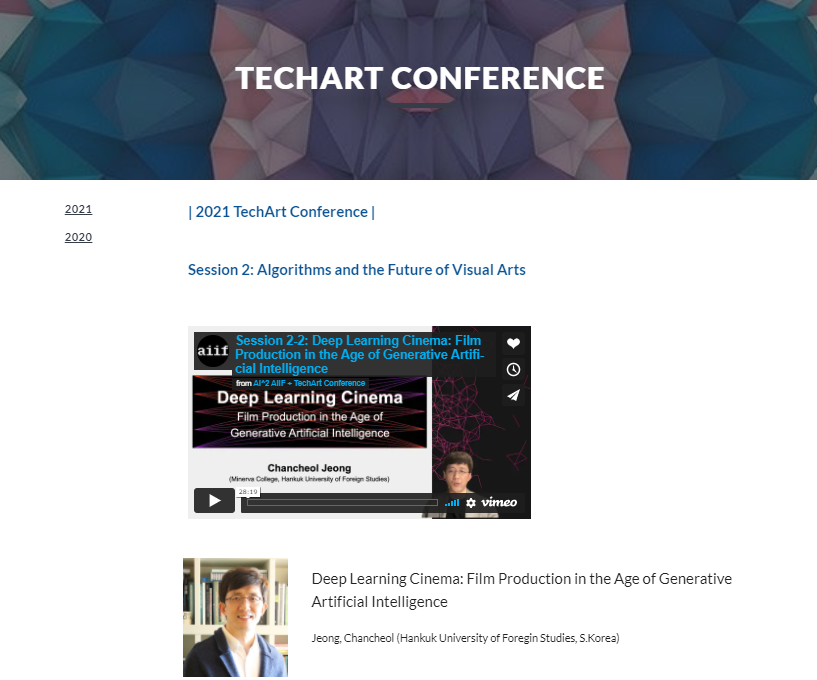
제작 단계에서 AI 기술 도입은 쉽지 않다. 다만, 최근 촬영의 영역에서 로봇공학과 인공지능을 결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자동으로 촬영 대상을 추적해 영상을 촬영하는 키라(KIRA)가 대표적이다. 정 교수는 제작 후 단계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작업의 효율과 정확도,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모션 캡쳐와 3D 애니메이션 등의 AI 기술이 결국 디지털 시각 효과를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초기 영화를 재생산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디올디파이(DeOldify) 기술을 통해 흑백 영상을 컬러로 전환하거나 어셈블넷(AssembleNet)으로 영상 속 장소의 위치를 파악한다. 또, 딥페이스(DeepFace)를 활용해 등장인물의 성별과 나이대 등의 정보를 확보하기도 한다.
정 교수는 AI 기반 문화 콘텐츠 기반 연구 ‘딥 포토플레이(Deep Photoplay)’를 소개했다. 무성영화를 유성으로 변환하는 연구로서 AI 작곡가가 영상 정보를 분석해 각 영화에 걸맞는 음악을 만들어낸다는 것. 그는 인간과 AI 연주자가 협업하는 모습이 최종 목표이며, 기술과 인간이 공존해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했다.
AI타임스 박유빈 기자 parkyoobin1217@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