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AI)을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예측 기술이 탄소중립 시대를 열어갈 핵심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전 세계적인 온난화 현상과 이에 따른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새로운 전력계통 시스템 전환을 불러일으켰다. 정부 ‘재생에너지 2030 이행 계획(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20% 달성)’에 따라 물리적 전력계통에서 벗어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9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주최, 한국광기술원에서 주관한 ‘2021 인공지능 연계 에너지 기술 포럼’이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8일부터 3일간 열린 국제 에너지 전문 전시회 ‘SWEET 2021’(Solar, Wind & Earth Energy Trade Fair 2021)에서 광주 인공지능산업융합직접단지 조성사업과 전력산업 광융합 기술 표준화 인증 기반 구축 사업 일환으로 진행됐다.

◆ 탄소중립시대 태양광 발전량 예측 기술 '주목'
첫 발표자로 나온 이현진 국민대학교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일사량과 태양광 발전량 계산에서 기계학습방법 모델의 정확도 검토’를 주제로 최근 기계학습을 적용해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하는 연구에 대해 소개했다. 이현진 교수는 “태양광과 풍력이 증가하면서 발전량 예측 기술이 화두가 되고 있다”며 “연구들 또한 물리적 접근법에서 나아가 통계적 모델인 기계 학습이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는 햇빛, 바람을 이용해 에너지를 만들어 친환경적이지만 기상상황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져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교수는 “신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단점은 기상 의존도가 높아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태양광을 설계하고 운영하려면 일사량 데이터가 필요한데 국내에는 이러한 데이터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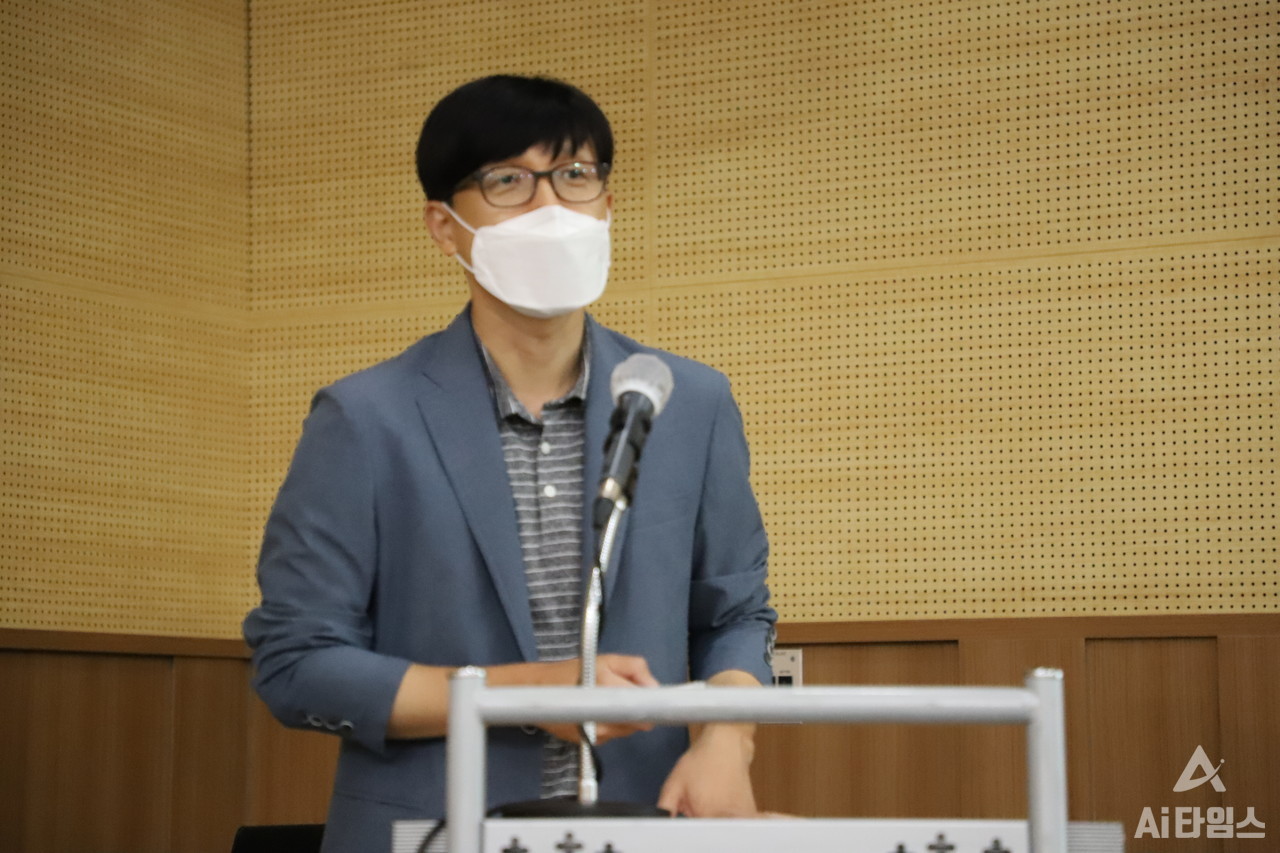
이 교수의 연구는 먼저 '일사량 데이터가 부족하다'라는 문제에서 출발했다. 발전량 예측에 기계학습모델이 얼마나 유용한가를 분석한 결과였다. 과연 인공지능 기계학습이 과거의 발전량 예측 모델을 개선할 것인지를 보는 게 주요 연구 내용이다. 풍속, 습도, 풍향, 운량 등 기상청에서 측정한 제공한 데이터를 활용했다. 일사량 데이터(GHI,DNI,DHI)는 국민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에서 수집했다.
* 일사량 종류
GHI (Global Horizontal Irradiation) 수평형 전체 일사량
DNI (Direct Normal Irradiation) 법선면직달일사량
DHI (Diffuse Horizontal Irradiance) 평면 산란 일사량
이 교수는 “미래 발전량 예측보단 현재 일사량 데이터가 부족했을 때 우린 어떻게 일사량 데이터와 발전량을 계산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다”며 “기존의 물리적 모델보다 머신러닝 모델이 오류가 적고, 장기간 평균 데이터를 분석할 때 편차를 0에 가깝게 줄여 정확도를 상당히 높게 개선한다”고 밝혔다.

◆ "너무 크고 복잡해"사람이 손대기 어려운 에너지 설비 AI로 미리 고장 예측
신재생에너지설비 이상 진단 기술에도 AI 융합이 활발하다. 풍력 등 에너지 설비는 한 번 고장이 나면 어디서 어떻게 고장이 발생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복잡하고 사람이 손대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는 에너지 설비 지능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이병탁 ETRI 박사는 ‘에너지설비 이상 진단 기술’를 주제로 ETRI에서 수행중인 에너지설비 지능화 AI 예측 연구 모델을 소개했다. 이 박사는 “에너지설비 지능화에 대한 3가지 AI 예측 요소로 ▲예측 ▲이상진단 ▲수명추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람이 손대기 어렵고 복잡한 에너지 설비를 고장 난 다음에 고치는 것이 아닌 미리 진단해 예방하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AI 기술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부착된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를 전처리하거나 예측, 에너지 패턴을 딥러닝으로 분석해 설비의 이상의 미리 진단하는 것과 기기의 수명의 추정하는 데 사용된다. 이병탁 박사는 머닝러신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설비 이상 진단에 대해 2가지 방법을 설명했다. 그는 “과거 에너지 패턴을 기반으로 현재 값과의 차이가 발생하면 기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해 이상진단을 하는 것”이고, “현재 패턴이 과거에 없는 패턴일 경우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을 주관한 김용현 한국광기술원 센터장은 “AI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분야 연구에서 예측 기술이 화두”라며 “발전량 예측의 경우 48시간 이후의 발전량을 예측하는 기술이 중요하며, 이를 기상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현재는 발전량 데이터와 센서를 활용하여 24시간의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이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은 국가의 안정적인 계통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로 최근 관련 기업 대상 인센티브 정책도 운영 중이다. 김용현 센터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은 신재생에너지를 사고파는 프로슈머 경제에서도 꼭 필요한 요소이며, 재생에너지는 발전량 예측이 어려워 전력 계통 운영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계통을 위해 ‘신재생 발전량 예측·입찰제도’를 마련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란 20MW 초과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전량을 하루 전에 미리 예측, 제출해 당일 일정 오차율 이내면 정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예측 오차율이 6~8%이면 kWh당 3원, 6% 이하일 경우 kWh당 4원의 인센티브를 제공 받는다. 6월 30일 정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통해 ‘신재생 발전량 예측·입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AI 연계 신재생에너지 포럼 전체 영상. (한국광기술원 공식 유튜브).
AI타임스 구아현 기자 ahyeon@aitimes.com
[관련기사] [2021 AI 연계 에너지 기술 포럼] 광주시, 똑똑하고 안전하고 유용한 에너지로 AI 기반 에너지자립도시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