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가 연평균 15%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단순한 수요 확대가 아니라 국가 전력계획과 송전망 체계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신호다.
문제는 속도 차이다. 데이터센터는 2~3년 만에 가동에 들어가지만, 송전선이나 발전설비는 최소 5~7년이 걸린다. 결국 수요와 공급의 '시차'가 누적되면서 전력 병목이 고착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센터 입지계획이 송전망 확충과 연계되지 못해 구조적 불일치가 반복된다고 지적한다.
"민간이 계획 단계부터 참여해야"
해법으로는 민간기업의 조기 참여가 제시됐다.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해 온 송전망 계획은 급변하는 산업 수요를 따라잡기 어렵다.
반면 미국은 'FERC 오더 1000'을 통해 민간기업이 송전선 계획과 투자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구글은 네바다주에서 AI·클라우드 전용 단지를 위해 민간 송전사업자와 함께 350마일 규모 전용 송전선을 공동 개발 중이다. 이는 데이터센터 투자 지연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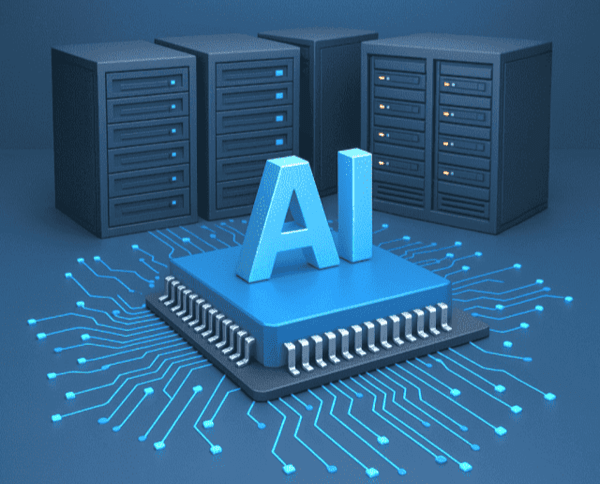
한국형 대응 방향, 정부-민간 협력 체제로 전환해야
국내 전문가들은 ▲데이터센터 인허가 시 송전계획 연계 의무화 ▲지방 데이터센터와 인근 발전소 간 직접 송전 제도 개선 ▲민간 투자형 송전사업 모델 도입 등을 제안했다.
특히 데이터센터가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자력·수소 등 모든 무탄소 전원을 조합해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중국은 '서전동송(西電東送)'과 '동수서산(東數西算)' 프로젝트를 결합해, 전력은 서부에서 동부로, 데이터 연산은 동부에서 서부로 이동시키는 구조를 추진 중이다.
이는 에너지·데이터 흐름을 동시에 최적화하는 전략으로, 한국도 송전망·입지·전원 믹스·데이터 이동을 패키지로 묶어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남긴다.
AI 활성화 정책은 곧 전력수요 대응 전략과 맞물린다. 이제 한국도 정부 단일계획 체계에서 벗어나,
민간기업이 송전망 계획과 투자 단계부터 참여하는 상향식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무탄소 전원 확대, 송전망 혼잡 해소, 지역수용성 확보까지 아우르는 종합 전략이 요구된다.
"AI는 에너지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말처럼, 전력 인프라 혁신 없이는 한국의 AI 산업 성장도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