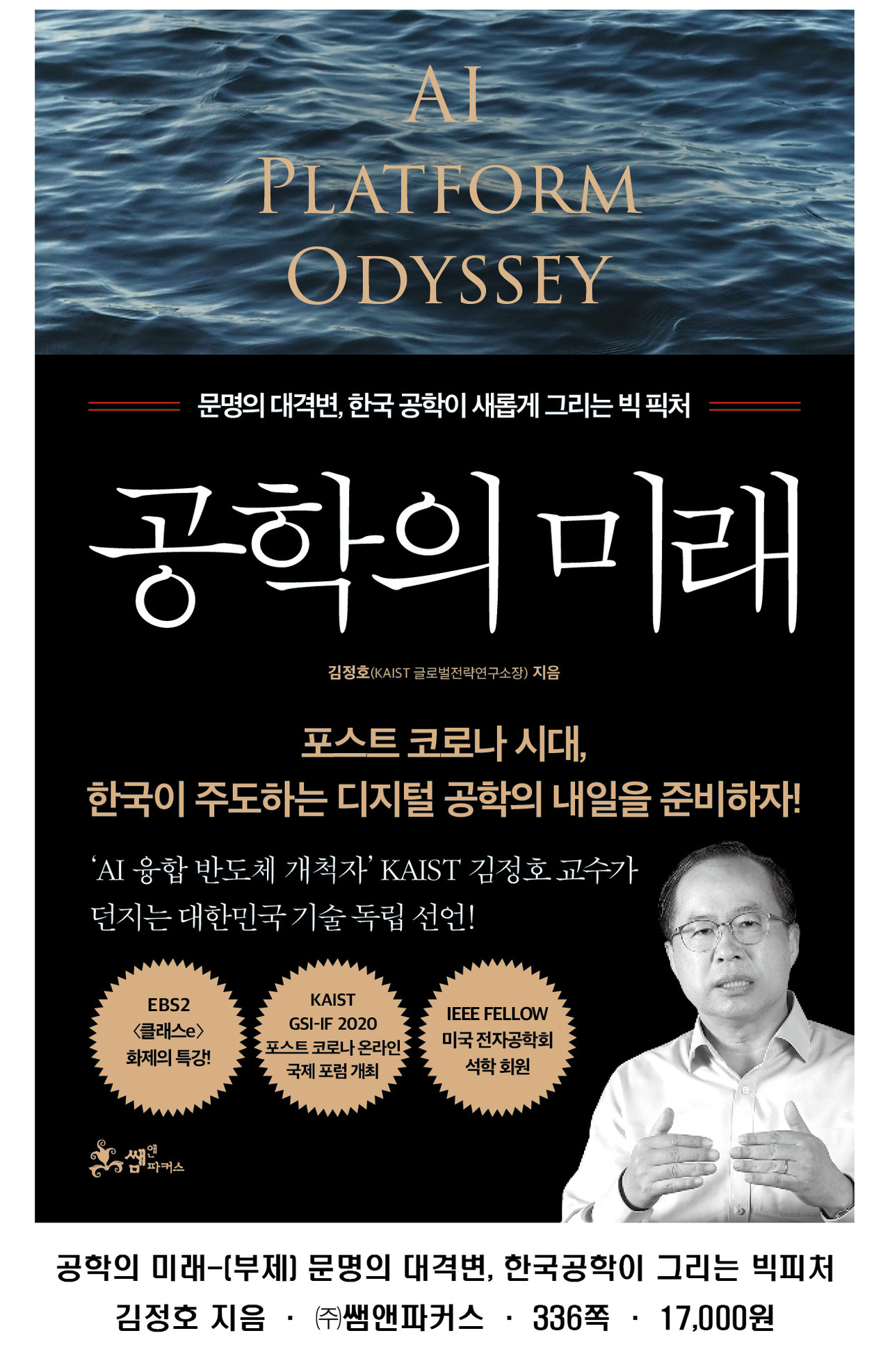
“창조성은 단단한 편견을 넘어 열린 마음에서 나오고, 디지털 공학이 인간을 닮은 모습을 할 때 진짜 혁신이 시작된다”
김정호 카이스트대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가 신작 ‘공학의 미래-(부제) 문명의 대격변, 한국 공학이 새롭게 그리는 빅픽처’를 출간했다. 디지털 변혁(Digital Transformation)과 코로나19가 촉발한 ‘기술 변곡’ 시대에서,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의 ‘퍼스트무버’로 치고 나갈 최적기라는 비전을 담았다.
저자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 공학’을 강조한다. 현재 대한민국을 사회적·문화적·기술적 문명 교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정의했다. 이에 디지털 기술 독립 등 한국 공학과 사회가 짚어야 할 문제를 논의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클라우드·반도체 기술 개발 방향과 인재 육성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김 교수가 변화의 폭이 큰 시대에서 필수 생존 요소로 꼽은 건 ‘창조성’과 ‘원천성’이다. 지금까지 우리 공학은 방향이 아닌 속도에 초점을 맞춘 ‘빠른 추격자’ 성장 모델에 익숙해져 있지만, 앞으로는 정해진 규칙 너머의 세상에 과감히 도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 공학 연구의 목표는 국제 과학 논문 색인(SCI· Science Citation Index)등재인 경우가 많았다. 그 탓에 연구는 소규모 실험에 머무를 뿐 의미 있는 성과를 찾기 어려웠다. 이에 김 교수는 우리 공학 연구가 실제 기업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한국 공학이 단순 기술 개발에 몰두하는 현상이라면 지금 위기가 지속될 것이지만, 인간 욕망의 방향을 따라 ‘디지털 융합 기술’을 추구하면 공학이 인류를 위해 기능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이를 위해 ▲자연과 대화할 수 있는 수학 ▲인간의 마음을 읽는 인문학 ▲영역을 넘어 소통하는 융합의 기술이 필수라고 김 교수가 설명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한국 공학이 이제부터라도 뿌리 깊은 `공학적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며 "융합적이면서도 실용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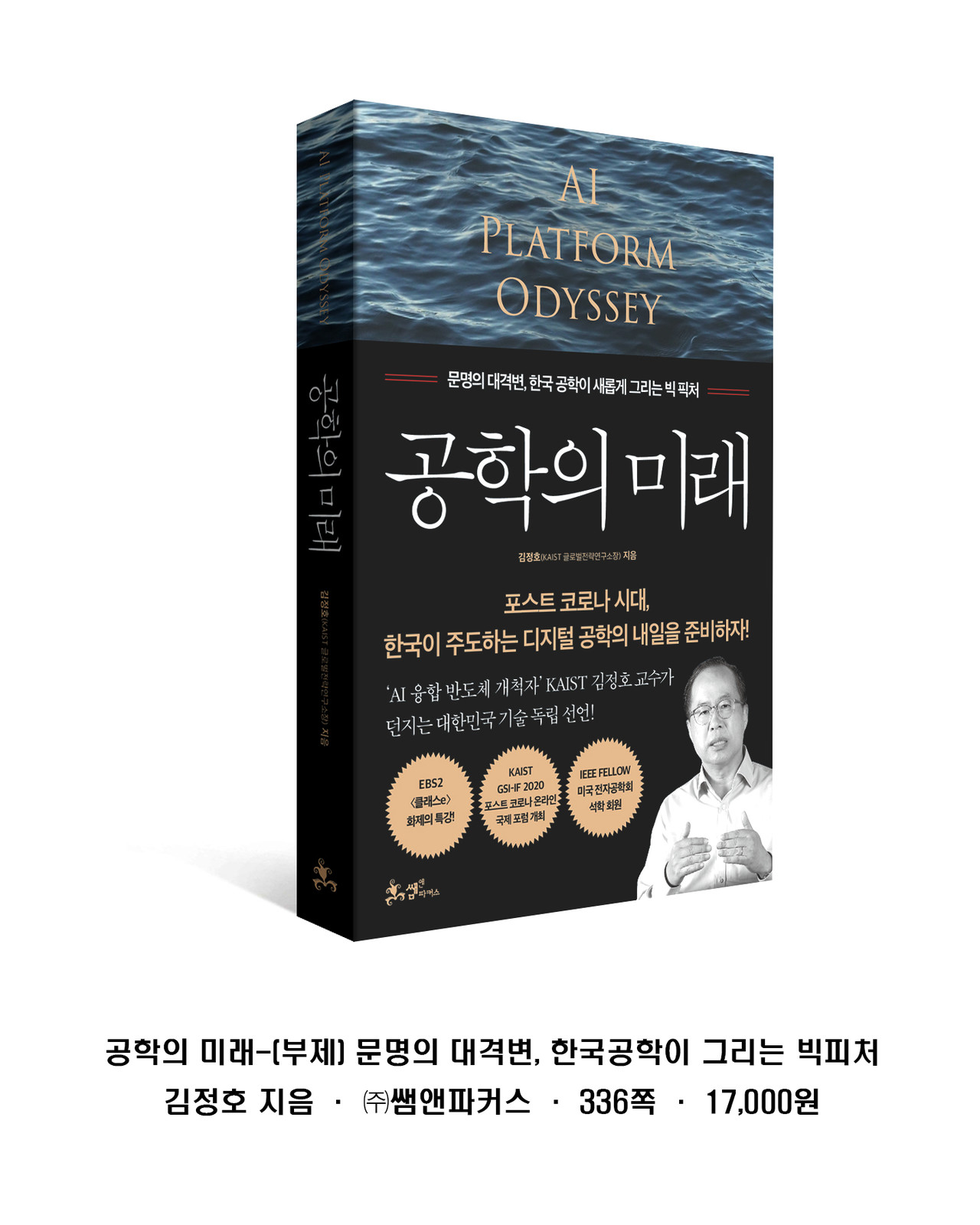
이밖에 김 교수는 미국 유학 시절 겪었던 일, 무선 배터리 충전 개발에 얽힌 일화, AI와 반도체 개발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들, 수학의 아름다움과 유용성, 디지털 공학과 인간의 관계, 무엇보다 KAIST에서 후학을 길러내며 느꼈던 인재 육성에 관한 소회 등 현장감 넘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다.
김정호 교수는 인공지능 반도체 컴퓨팅 융합 연구의 선구자이자 고속 반도체 설계 전문가다. 마이크로소프트 아카데믹 (Microsoft Academic)에서 HBM 메모리 반도체 분야로 세계 1위 연구자에 선정된 바 있다. 현재는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 AI 대학원 겸임교수, 글로벌전략연구소(GSI) 소장, 삼성전자 산학협력센터 센터장, 한화 국방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 장을 맡고 있다. 미국 전자공학회 석학회원(IEEE Fellow)이다.
AI타임스 장희수 기자 heehee2157@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