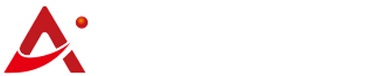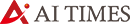싱크탱크인 미국 경제연구소(AIER)가 현재 인공지능(AI)을 두려워하는 것은 역사의 반복에 불과하며, AI가 인간을 대체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또 AI를 저주하는 것은 이를 만든 인간의 마음과 사고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IER은 19일(현지시간) 아트 카든 수석 팰로우 겸 샘포드대학교 경제학 부교수의 칼럼을 통해 AI로 인해 인간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직 먼 훗날의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1~2세기 전의 경제학자들의 말을 인용했다.
이 글은 'AI로 인해 인간의 날이 끝나는 것은 (아마도) 아직 멀었다(Artificial Intelligence: Our Days (Probably) Aren’t Numbered)'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카든 수석은 먼저 19세기 초 러다이트 운동을 통해 노동자들이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지적했다. 이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일어났던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가 결국은 백인들이 자신들의 지위와 소득을 지키기 위해 펼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기술이나 인종 문제 등은 공통적인 이유, 즉 특정 계층의 이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AI가 바로 그 자리를 대체한다고 전했다. 모든 혁신에는 기득권의 반대가 뒤따른다는 것이다. AI로 인해 모든 일자리가 없어지고 대량의 실업 사태가 일어날 것을 우려한 까닭이다.
하지만, 이 가정은 틀렸다고 단언했다.
많은 전문가는 AI가 '창조적인 파괴'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창조적인 부분은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봤다. 기껏 새로운 앱과 서비스로 삶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반면,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흔하게 일어나는 공장 폐쇄만큼 극적이지 않고, 인터뷰할 절망적인 해고 노동자도 없다고 밝혔다.
AI로 인해 생산성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중복되는 자원을 더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봤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배적 문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과거 러다이트나 아파르트헤이트처럼 반발에 나설 것은 필연적으로 봤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주기적인 배분의 피해를 감수하는 것은 생활 수준을 크게 높이는 데 드는 대가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카든 수석은 "여기에 내 묘비를 쓸 위험을 감수하지만, AI의 위협은 아마도 과장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예로 팬데믹 동안에 발생한 학습 손실은 결국 온라인 학습이 대면 학습을 대체하기 좋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 줬다고 들었다. 이는 인간이 접촉과 대화로 먹고살며, 여기에는 AI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할 인간적인 뉘앙스가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AI는 직관을 가진 인간처럼 효율적으로 시간과 장소 등 특정 상황에 대한 지식을 파악하고 응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실제로 인간이 좋아하고 일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시장경제의 지지자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이를 "시간과 장소의 특정 상황에 대한 많은 지식은 실제로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은 일반적으로 표현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기계나 AI로 인한 자동화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뒷받침한다는 말이다.
경제사학자 조엘 모키르와 크리스 비커스, 니콜라스 지바스 등은 AI가 '세계 최고의 연구 조수'가 될 수 있지만, '세계 최고의 연구자'가 될 가능성은 작다고 주장했다 .
마지막으로 카든 수석은 AI를 미워하거나 저주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기술적 변화는 많은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한다"라며 "AI는 진정으로 '지능적'이 아니더라도 창조적 협력의 기념비적인 업적이며, 더 창의적인 노력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확보한다"라고 말했다.
프랑스 경제학자 프레데릭 바스티아의 말을 인용, "기계를 저주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저주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기술을 미워하는 것은 가장 인간적인 일, 즉 사고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