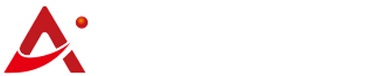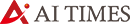봄, 그 이름만으로도 설레는 계절의 캠퍼스

봄이 오면, 국립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교정은 마치 시간이 잠시 멈춘 듯한 풍경으로 피어난다.
캠퍼스 곳곳에 자리한 벚나무들이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리면, 하늘빛은 더 맑아지고 바람은 분홍빛 향기를 머금은 채 조용히 스쳐간다.

순천대학교의 봄은 정원의 도시답게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움이다. 순천만의 너른 품처럼 포근한 교정과 완만한 언덕길 사이로 벚꽃이 구름처럼 피어나 학생들의 발걸음을 환하게 밝힌다.
교정 곳곳에서 바라본 캠퍼스의 길 위에는 꽃비가 부드럽게 흩날리고, 그 아래 나란히 걷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봄의 정취를 더한다.
순천만 정원과 잇닿은 듯한 이 캠퍼스의 풍경은 학문과 삶, 자연이 어우러지는 진정한 '배움의 정원'이라 불러도 좋을 만큼 싱그럽고 깊다.

목포대학교는 또 다른 결을 지닌 봄의 시(詩)다.
바닷바람에 실려온 봄기운은 넓은 잔디밭과 캠퍼스 언덕을 감싸 안고,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꽃물든 교정은 그 자체로 한 폭의 수채화다.
유달산 너머로 물든 석양과 어우러지는 벚꽃의 풍경은 지리적 고요함과 감성적 깊이를 동시에 전한다.

목포대의 봄은 마치 다도해의 수많은 섬들처럼, 조용하고 정겹게 피어나는 삶의 순간들을 간직하게 한다.
이 두 대학의 봄은 단순한 계절의 통과점이 아니다. 벚꽃 아래 스민 청춘의 대화, 벤치 위의 책장 넘기는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 아래 살아 숨 쉬는 '지금 이 순간'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을 추억으로 남는다.

햇살이 말을 걸기 시작할 무렵
순천대학교의 언덕엔
첫 벚꽃이 살며시 입을 열었다.
겨울의 끝자락을 견딘 가지마다
분홍빛 숨결이 내려앉고,
책을 안은 청춘들의 어깨 위로
바람은 꽃잎을 띄워 건넨다.
정원의 도시, 순천답게
캠퍼스는 어느새 하나의 정원.
야트막한 교정의 언덕길 사이로
벚꽃은 들숨처럼 피어
하늘과 땅 사이를 잇는다.
그리고 저 멀리,
목포대학교의 교정에도 봄이 깃든다.
바다를 닮은 바람이
벚꽃 사이를 헤집고 지나가면,
고요한 잔디밭 위에
꽃잎이 물결처럼 번진다.
유달산의 실루엣을 등에 지고
목포대의 봄은 좀 더 느릿하다.
그 느릿함 속에 피어나는 고요는
마치 시 한 줄의 여백처럼,
학생들의 발걸음을
조용히 감싸 안는다.
두 캠퍼스에 깃든 이 봄은
한철 스치는 풍경이 아닌
젊음의 계절이 건네는 속삭임.
우리의 어느 기억 속에서
오래도록 피어나고 지는
시간의 꽃이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