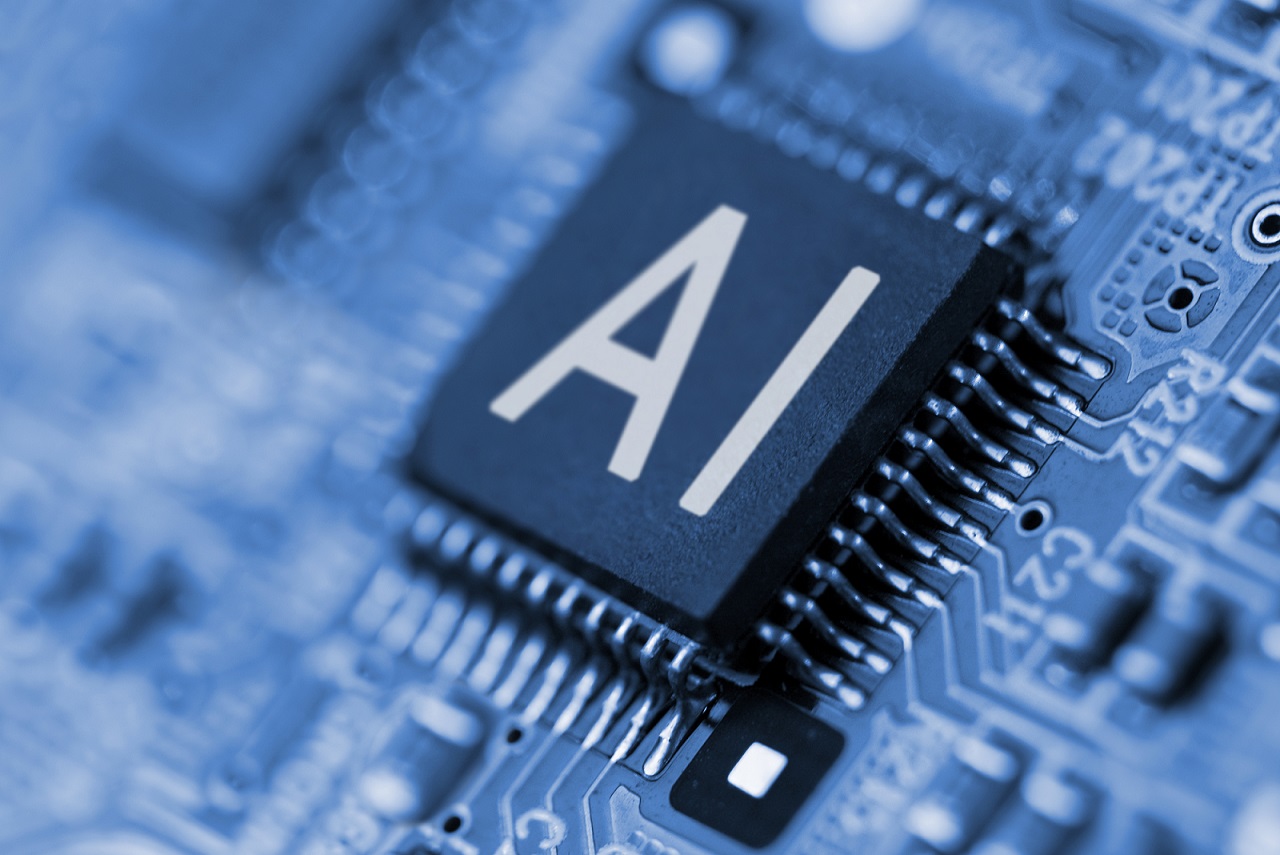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직무대행 박래길)이 자연의 원리에서 영감을 받는 '청색기술'을 활용해 뉴로모픽 반도체를 개발한다.
GIS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슈퍼비전 AI를 위한 겹눈모방 뉴로모픽 반도체' 주제 주관기관에 선정돼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68억7500만원의 예산을 확보, 곤충 시신경을 모방한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뉴로모픽 반도체는 미래차용 라이다ㆍ레이더ㆍ카메라ㆍ프로세서ㆍ메모리 등 AI 기반 센서 기술을 고도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기존 '폰 노이만 구조' 반도체는 주기억 장치, 중앙 처리 장치, 입출력 장치 등 3단계로 이뤄진 프로그램 내장형 컴퓨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구조는 나열된 명령을 순차적으로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전송회로의 병목 현상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반면 곤충의 겹눈 신경망을 모방한 반도체는 위치와 모션 감지에 최적화돼 저전력과 고연산 능력을 갖출 수 있다. 덕분에 겹눈 모방 뉴로모픽 반도체는 센서-메모리-컴퓨팅 일체형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다.
이는 기존 자율주행 자동차의 카메라가 지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곤충의 동작 감지 능력을 통해 미래 움직임을 예측하는 구조로 발전시킬 수 있어 '슈퍼비전'이라고 부른다.
GIST는 핵심기술 개발 전략을 3단계로 나눴다. ▲곤충의 겹눈 모방 렌즈기술 개발 ▲메모리 기반 시신경 뉴로모픽 칩 개발 ▲모션 감지 기능 구현 및 평가 순이다.
이를 위해 석·박사 급 연구 전담 전문인력 45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한국에너지공대에서 소자 테스트를, 한국광기술원에서 광학렌즈와 소자 관련 시험·평가 장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의 목적은 최근 20년 정부의 기조에 따라 광주의 주력 산업이 ▲광산업·클린디젤·가전·인공지능·반도체 등으로 변화했고 ▲1조원 국가예산 투입에도 광 산업의 '위기 수준'이 높으며 ▲광주-전남의 'AI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활동이 치열해지는 등 ▲차세대 먹거리 육성 필요성이 높아지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송영민 교수는 "해외에서는 동물의 시각 구조를 일부분만 모사한 기술을 연구하던 사례가 있었으나 우리가 진행하는 연구는 곤충 신경계 전체를 파헤쳐 모사해보자고 생각한 것이 계기가 됐다"며 "곤충들은 인간에 비해 뇌세포가 훨씬 적지만 물체의 경로를 예측해서 행동, 이것이 경량의 이점을 가지면서도 저전력으로 원하는 위치로 움직이는 행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나호정 기자 hojeong9983@aitimes.com
- GIST, 국내 최대 교육연구용 AI 인프라 본격 운영
- GIST 제9대 총장 선임 부결
- GIST, 4배 더 오래 쓰는 리튬금속배터리 핵심기술 개발
- 삼성, 반도체 인재 양성 위해 지방 계약학과 3곳 신설
- GIST 공동연구진, 갑오징어 눈 닮은 고대비·고해상도 카메라 개발
- 감성텍, 'AI 심장 카메라' 의료기기 등록 추진
- 광주 AI 통합지원 서비스 플랫폼 오픈
- 김준하 AI산업융합사업단장, '챗GPT' 시민 교육 진행
- GIST 아카데미 4월 조찬포럼 개최..."AI 시대, 예술의 정의란”
- GIST, 모르는 데이터 구별하는 AI 기술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