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기업들이 인공지능(AI)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언어모델의 크기로 빅테크와 경쟁하기보다, 로보틱스와 결합한 AI 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건 우리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산업이니까 경쟁자가 없습니다."
장병탁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겸 인공지능연구원(AIIS) 원장은 '신체를 가진 AI(embodied AI)'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AI 로봇 산업이 유망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머신러닝(ML) 분야 국내 최고전문가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재학 시절 AI를 처음 접한 이후 30여년을 집중했다. 특히 로봇과 AI 접목 분야로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장 교수가 말하는 신체를 가진 AI란 모터와 액추에이터로 움직이며 센서로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AI다. 인간이 오감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AI가 직접 사물을 보고 만지면서 스스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학습한다.
"시각-언어-행동(Vision-Language-Action)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로 정제한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면서 실제 세상을 학습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필요한 겁니다."
현재의 대형언어모델(LLM)은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 확률적으로 유사한 단어를 추론하는 것에 불과하다. 실제 세상을 배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 하는 셈이다.
장 교수는 "지금의 챗GPT처럼 축구에 대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 하는 AI가 아니라, 실제로 눈으로 공을 보고 발로 차보면서 축구에 대해 학습하는 AI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런 접근법은 생물의 진화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단세포 동물을 보면 행동이 최우선입니다. 먹느냐 먹히느냐는 생존 본능이 공격하거나 도망가는 행동을 만듭니다. 맛이나 시각, 온도에 대한 감각들은 행동을 촉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진화가 진행되면서 인간처럼 언어가 발달한 것이죠."
"그에 반해 AI는 인간의 언어부터 학습해 '사상누각'과 같습니다. 기반이 되는 행동을 구현하지 못한 셈입니다. AI가 행동할 수 있고 주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로봇의 형태는 인간을 닮았을 때 환경에 적용하기 더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인간의 감각과 닮은 센서를 가지고 육체적 제약을 경험하는 AI는 인간과 유사하게 생각할 확률이 높다는 논리다. 바로 이 점이 인공일반지능(AGI)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엔지니어의 관점으로 본다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AI는 인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기만 하면,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미 엄청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장 교수가 밝힌 AI의 발전 단계에 따르면 최종 목표는 인간을 뛰어넘는 '슈퍼휴먼 AI'이지만, 현재는 2단계 딥러닝 시스템 수준에 불과하다. 그는 다음 단계인 '셀프-티칭 시스템', 즉 스스로 학습하는 러닝머신을 연구하고 있다.
물론 인간과 비슷한 감각을 가지고 스스로 학습하며 움직일 수 있는 AI는 유용한 동시에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지금의 방식처럼 인간이 정제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드시 AGI을 만들거나, 인간을 닮은 형태일 필요가 있을까.
이 질문에 장 교수는 "똑똑한 AI는 자율적인 AI의 형태일 텐데, 동시에 통제가 어렵다는 딜레마가 있다"라고 인정했다.
"AI가 스스로 학습하기 시작하면 재학습 과정에서 인간의 기획 의도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닉 보스트롬과 같은 인문학자들이 논리적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술 발전을 제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에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AI는 결국 인간에게 유용한 도구여야 하며, 로보틱스와 결합한 AI가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했다.
"로보틱스와 AI가 결합하면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력 감소와 같은 사회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무직 노동자들에게는 챗봇이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지만, 노동력이 필요한 산업군에서는 AI 도입이 도움이 된다. 제조나 건축 등에서 반복적이고 위험한 육체 노동을 AI 로봇이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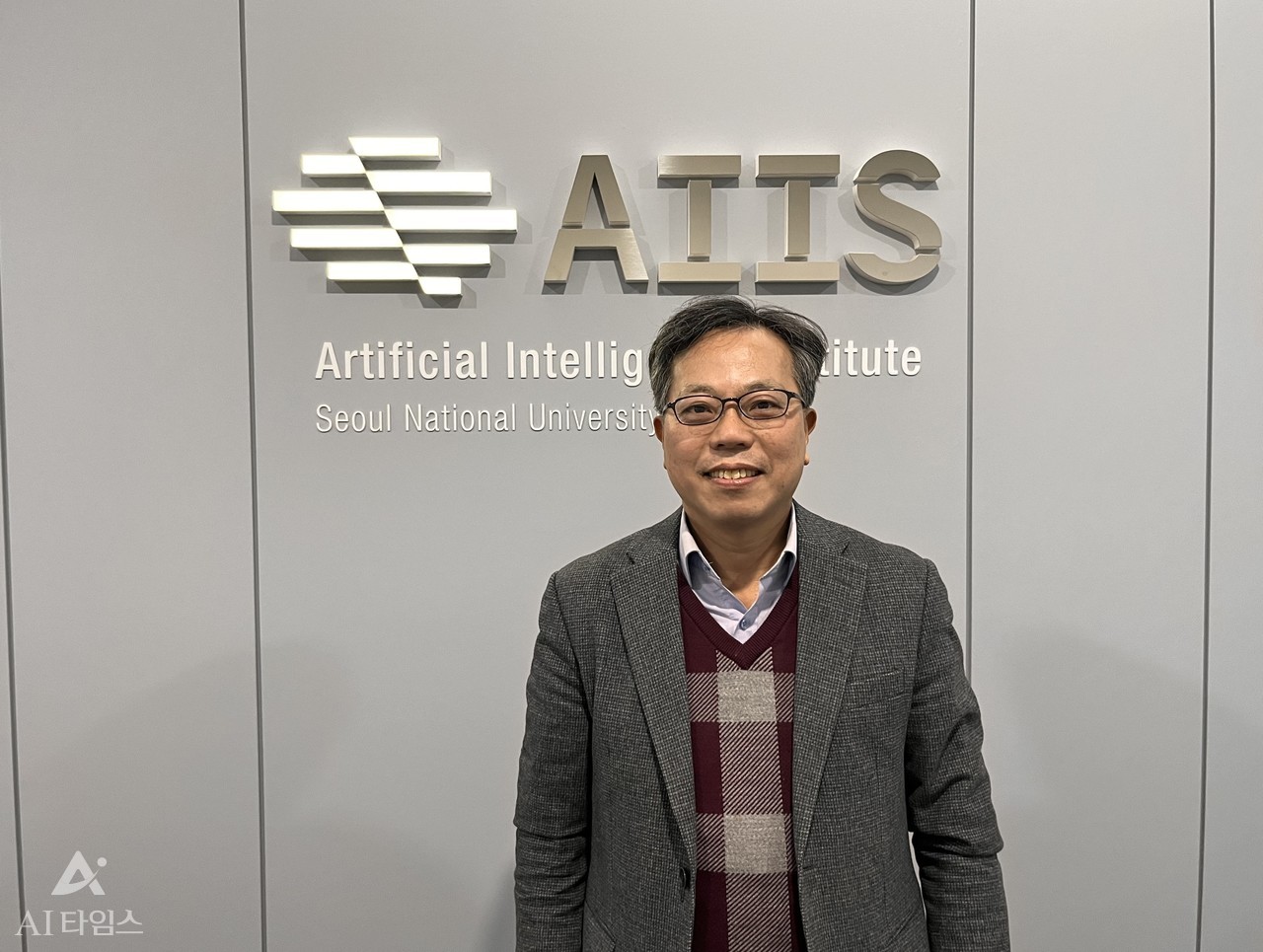
AI 연구 분야에서도 로보틱스와의 결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원 학생들에게 알고리즘을 로봇으로 구현해 보도록 권하는 편입니다. 기계에 적용하면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기계공학과 출신의 학생도 AI 연구원에 선발할 정도로 기계공학과 컴퓨터공학의 융합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었다. 아울러 철학과 인문학,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에게 학제적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AI는 사회 전반에 적용되기 때문에 학문의 경계에 갇힐 이유가 없습니다."
장병탁 교수는 최근 가사 로봇과 쇼핑 로봇도 연구하고 있다. "로빈 윌리엄스가 출연했던 영화 '바이센테니얼 맨'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안일도 해주고 마트에서 원하는 물건도 사주는 것이죠. AI는 도구를 넘어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AI일 겁니다."
한편 장 교수의 예측대로 이 분야는 최근 글로벌한 최신 연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파리에 있는 화웨이 노아 방주 연구소(Noah's Ark Lab) 연구진도 며칠 전 '체화 인공지능(E-AI)를 위한 잠재적인 프레임워크'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AGI로 발전하기 위해 신체가 있으면 AI가 행동, 기억, 경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박수빈 기자 sbin08@aitimes.com
- 스튜어트 러셀 "AI 모델 문제 발생 시 강제 중단하는 '킬 스위치' 필요"
- 지능정보산업협회-서울대학교 AI연구원, AI최고경영자 과정 3기 모집
- 유명 액셀러레이터 투자 1순위는 'AI 로봇'
- 정부, 차세대 첨단로봇 기술개발에 523억 투자
- 인간 성장 과정을 따라한 'AI 차일드' 등장..."최초의 AGI 프로토타입"
- 에이딘로보틱스, MODEX 2024 전시회 한국관 참가… 물류용 로봇 피킹 솔루션 공개
- MS, AGI 개발 위해 로봇 선두 생츄어리 AI와 손잡아
- 'AI의 대모'도 AGI 개발 동참...페이페이 리, '공간 지능' 스타트업 설립
- 'AI 대모'의 공간 지능 스타트업, 설립 4개월 만에 유니콘 등극
- [챗GPT가 본 2024] 국내 AI 업계 화제 인물 톱 5
- 오세훈 서울 시장, 3대 AI 강국 도약 위한 7대 전략 발표
- 'K-휴머노이드 연합' 창립 총회...장병탁 교수 위원장 추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