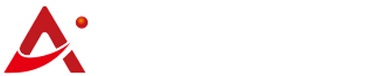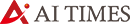미국과 중국의 AI시스템 의존률이 높은 유럽 기업들이 지속적인 비용상승으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유럽연합(EU)이 추진중인 AI 규제법이 미국 빅테크 기업보다는 유럽 기업에 덤터기를 씌우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삶의미래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런 경고를 내놨다고 사이언스비즈니스를 비롯한 다수 외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삶의미래연구소는 유엔과 미국정부 및 EU가 함께 세운 기관이다. '라이프3.0'의 저자인 맥스 테그마크 MIT교수가 대표를 맡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기업들은 여러가지 AI 제품이나 도구를 만들어 내는데 기초가 되는 범용 AI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지 않고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바이두 등 미국과 중국 기업의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범용 AI 시스템은 오픈AI의 'GPT-3'를 비롯해 딥마인드의 '고퍼', 구글의 '람다', 바이두의 '어니3.0 타이탄', 화웨이의 '판 구' 같은 대형 AI 모델을 지칭한다.
오픈AI의 대형 언어 모델인 GPT-3와 같은 범용 AI 시스템은 챗봇이나 자동 번역, 광고문구 생성 등의 응용 프로그램에 제작 기반을 제공한다. 올해 등장한 달리 등 생성AI 도구들은 글 뿐만 아니라 오디오와 이미지, 비디오도 만들수 있게 해준다.
GPT-3를 대체할 수 있는 AI시스템으로 한국에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이스라엘에는 AI21랩의 쥬라식1과 같은 언어모델이 있지만 유럽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독자 시스템이 없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 따라 유럽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증대뿐 아니라 AI 규제의 대상이 되면서 갈수록 부담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예를 들어 GPT-3는 생성하는 단어 마다 비용을 매기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쓸수록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무엇보다 GPT-3가 학습한 편견이나 유해 콘텐츠가 미중 AI시스템 의존도가 높은 유럽 기업의 AI제품에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AI 규제의 표준을 세우려는 EU의 의도가 실패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당국의 제재를 해당 기업만 받고 정작 범용 모델을 만든 빅테크 기업은 빠져 나가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유럽 지역을 기반으로 범용 AI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는 독일의 알레프 알파라는 스타트업과 연구기관들이 참여한 ‘유럽 거대 AI 모델(Large European AI Models)’ 프로젝트 뿐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러나 AI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막대한 훈련 비용 때문에 “유럽의 소규모 기업들이 조만간 글로벌 경쟁업체들을 따라잡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정병일 위원 jbi@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