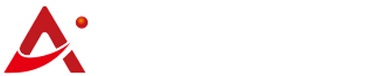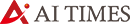CES에 관한 국내 최고 전문가를 꼽자면 이한범 정보통신기술산업협회(KICTA) 상근부회장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2017년 국내 스타트업 28곳을 이끌고 CES에 참가, 현재는 무려 10배나 늘어난 273개로 키워냈다. 더불어 CES에 지자체들이 적극 참가하게 된 것이나, 대학 부스가 자리 잡게 된 이면에는 이한범 부회장의 노력이 숨어있다.
그 결과 이번 CES에서 한국기업은 사상 최대 규모인 469개사가 참여, 중국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참가 기업의 수는 행사에서 국가의 위상을 말해준다. CES 무대에서 한국 기업들이 받는 대우가 달라졌다고 이 부회장은 설명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참여 기업 수만 많은 것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가는 무대가 돼야 한다는 말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체계적인 부스 관리'를 우선 꼽았다. 국내 기업 300곳 이상이 집중적으로 모인 '유레카관'은 투자 유치를 원하는 석박사 과정들의 무대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지자체 및 정부·기관까지 몰려 부스를 열었다. 그러다보니 관련성이 없는 기업들끼리 몰리며, 현장을 찾은 투자자들의 관람 효율만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의 중요성을 꼽았다. 같은 기술 기업끼리 카테고리를 구성하고, 투자가 필요한 기업과 판로 개척이 필요한 기업을 따로 묶어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말이다.
지속적인 참가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타트업이 보통 기술 완성을 위해 3~5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국가 지원은 2년에 그친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전시 무대에서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신뢰를 얻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번 행사에서 스타트업은 숫자가 크게 늘었지만, 중소기업은 정체 추세인 것을 예로 들었다.
"CES에 참가해도 기업이 살아남을 확률은 5~10%에 불과하다"며 "여기에서 반드시 성공의 발판을 만들 수 있도록 참가기업과 관계자들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CES가 끝난 뒤 지원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드러난 세계적 추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CES는 미국소비자협회(CTA)의 사업 무대이기도 하다"며 "사업성이 없는 카테고리는 CES에서 사라지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 예로 CTA가 키워드로 꼽은 '디지털 헬스'를 가장 유망한 트렌드로 봤다. 이 밖에 인공지능과 로봇, 스마트 시티 등도 향후 수년간 성장할 분야로 꼽았다. 반면 드론과 3D 프린팅은 기울어 가고 있으며, UAM과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아직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제는 빅테크는 물론 중소기업도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한쪽만으로는 성공하기 힘들며, 사업 아이템도 다양화하지 않으면 빠른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마지막으로 "CES 참가 문제나 사업이나 중요한 것은 지속의 문제라는 것"이라며 "CTA가 이번 CES의 키워드로 '지속가능성'을 뽑은 게 참 의미심장하다"며 미소 지었다.
라스베이거스=특별취재팀(전동희 부국장 cancell@, 이주영 기자 ezooyng@aitimes.com)